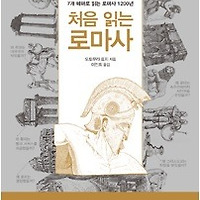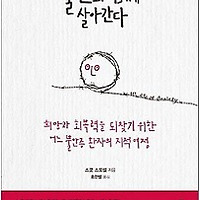| 음식이 상식이다 -  윤덕노 지음/더난출판사 |
단무지. 일본어로 다쿠앙(たくあん)이다. 겨우내 먹을 것이 없던 저 옛날 다쿠앙이란 스님이 짠지의 일종으로 만든 것으로, 당시 절 근처를 지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스님의 이름을 그대로 따 '다쿠앙'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사찰이라는 장소도 장소이거니와 계절, 또 음식을 오랜 시간 보관해야 하는 애로로 인해 만들어졌을 터다. 책에는 비슷한 맥락으로 낫토(納豆)와 청국장이 등장한다. 낫토의 유래에 관한 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단무지와 매한가지로 절과 관련이 있다. 옛날 일본에서는 절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품을 만들어 관리하는 납소(納所)가 있었다는데, 이 납소에서 콩 발효 식품을 관리했기 때문에 납두(納豆)라는 이름이 생겨 바로 여기서 낫토가 유래되었다는 거다(p.254)ㅡ또 다른 하나는 사무라이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말에게 먹일 콩을 삶다가 적의 공격을 받자 콩을 버리기가 아까워 섶에 콩을 담고서 그대로 도망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지푸라기에 들러붙은 곰팡이 때문에 콩이 발효됐단다). 『음식이 상식이다』의 책날개에는 '먹는 얘기는 언제나 즐거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뿐 아니라 그 음식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깃거리는 더 흥미롭고 즐거이 느껴진다. 얼마 전 한국의 라면 소비량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 76개라는 것. 라면? 당연히 이 책에서도 다룬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는 50년대 후반 일본의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이(최초 개발자는 안도가 분명하나 라면 자체의 기원에 대해서만큼은 다종다양한 해석이 있다ㅡ심지어 '라멘'이라는 말의 어원까지도) 밀가루로 식품을 개발하던 중 포장마차에서 어묵에 밀가루를 발라 튀기는 것을 보고 착안했다고 한다. 당시엔 면 자체에 양념을 한 것이었는데 지금과 같이 분말 수프가 따로 나오게 된 건 그로부터 3년 후라고(한국에서는 1963년 삼양식품에서 처음 생산했다는데, 내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학교에 바투 붙은 삼양라면 공장 굴뚝에서 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글을 읽다 곰곰 생각해보니, 라면을 처음 접하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껏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 왔는지는 도저히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어젯밤에도 요깃거리로 컵라면 하나를 뚝딱 해치웠으니!).
무심코 베어 먹는 사과 한 쪽. 겉보기에는 단순한 사과지만, 역사와 연결해보면 철학적, 정치적, 과학적, 미학적으로 다양한 뜻이 숨어 있다. 뉴턴의 사과 (...) 이브의 사과 (...) 세잔이 그린 사과 정물 (...) 머리 위에 올려놓고 화살로 쏜 윌리엄 텔 (...)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속에는 그보다 더 다채로운 이야기와 역사가 숨어 있다.
ㅡ 본문
그런데 어디 라면만 그럴까. 개인적으로 특히 면 요리를 좋아해서 어딜 가든지 즐겨 먹는데, 한때 일본에 장기간 체류했을 적에 덴푸라우동을 수차례 먹었던 적이 있다. 이 덴푸라(天婦羅)ㅡ튀김, 역시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온다. 그가 처음으로 생선(도미) 튀김을 먹어보곤 맛에 매력을 느껴 기름진 음식을 과식해 복통을 일으켰다는 덴푸라(일시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결국 석 달 후 사망했다). 당시 튀김 요리에 쓰는 값비싼 참기름 탓에 극소수의 상류층만 즐겼다고 하는데, 16세기 일본에 들어온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전파했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다. 더군다나 덴푸라라는 말의 어원 또한 라틴어로, 튀김과 전혀 무관한 '사계절'이라는 의미라고 한다.(p.388) 가톨릭에는 사계절이 시작될 때 고기 대신 생선을 먹는 사계재일(四季齋日)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바로 그 사계재일, '콰투오르 템포라(Quatuor Tempora)'에서 '템포라'가 '덴푸라'로……. 거 참, 늘 옆에 두고 먹는 소소한 음식 하나하나에도 별의별 역사와 이야기가 존재하는 걸 보면,ㅡ이 『음식이 상식이다』 개정판 첫머리에 적힌 것처럼 책은 소위 '맛집 정보'를 다루지는 않는다ㅡ무엇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분위기에서 먹었는지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저자의 말 역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역사와 문화가 섞인 다채로운 음식 이야기, 미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사실들, 음식 잡학 사전이라 할 만하다.